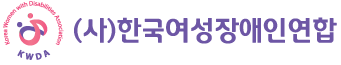한국여장연 웹진
47호
47호

- ㆍ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보
- ㆍ (여는글) ‘절정’ 그 깊고 짙은 참맛으로
- ㆍ 2013년 한국여장연 ‘제15차 정기총회’와 ‘중점운동방향’
- ㆍ 사진으로 보는 2013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지부·회원단체 정기총회
- ㆍ (기획이슈) 장애학의 접근법
- ㆍ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
- ㆍ 한국수화기본법의 제정의의와 제정추진연대 활동 방향
- ㆍ (활동가 이야기 마당) 장한 10년차 활동가상 수상자 소감 한 말씀~
- ㆍ 알아두자
- ㆍ 여장연 소식
- ㆍ (신한카드 “아름人”을 통한 후원안내)
- ㆍ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ㆍ 고마운 분들
(기획이슈) 장애학의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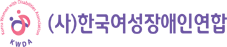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2호 (우 07236)
Tel. 02) 3675-9935, 02) 766-9935 Fax. 02)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홈페이지 유지보수 : 그루터기
COPYRIGHT(C)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LL RIGHT RESERVED.
Tel. 02) 3675-9935, 02) 766-9935 Fax. 02)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홈페이지 유지보수 : 그루터기
COPYRIGHT(C)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