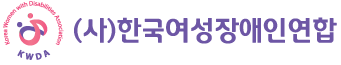46호

- ㆍ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보
- ㆍ (기획이슈) 장애학의 발전
- ㆍ 전체활동가 워크숍!! “만나서 반갑습니다^^”
- ㆍ 제18대 대선 여성장애인 3대 핵심공약발표
- ㆍ 아 · 태 장애인대회 및 DPO united 결성의 의의와 전망
- ㆍ (여성장애인 이야기 마당) 경남지부 10주년 행사 및 향후 운동 전망
- ㆍ (부설기관) “우리가 어울림에 남아있는 멋진 이유들”
- ㆍ 알아두자
- ㆍ (신한카드 “아름人”을 통한 후원안내)
- ㆍ 여장연 소식
- ㆍ (성명서) 중증여성장애인 故김주영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 ㆍ (성명서)
- ㆍ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ㆍ 고마운분들
<기획이슈>
장애학의 발전
-조 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난번에는 왜 장애학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번에는 장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사실 장애학의 또 다른 중심은 영국이지만, 영국에서의 장애학의 발전에 관해서는 필자가 깊이 알지를 못한다.
장애학의 발전은 장애인 권리운동의 발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1960년대 미국의 인권운동은 흑인의 인권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따라서 그 당시 인권이라 말할 때는 주로 흑인의 인권을 연상했으며, 장애인의 인권은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흑인의 인권운동은 1964년 민권법 (Civil Rights Act)의 제정으로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식이 없었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미국의 민권법은 인종*성별*종교*국적에 기초하여 공공의 편의시설, 민간 부문의 고용,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장애인은 그 획기적인 민권법에 의해 적용되는 계층에 속해있지 못했다. 그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조항을 민권법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중에 혹 흑인의 인권에 관한 조항들이 후퇴하지 않을까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당시 인권운동이 장애인의 인권을 담보하지는 못했지만, 흑인의 인권운동을 바라보면서 장애계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자각이 서서히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흑인 인권운동의 운동 방식을 장애인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은 1970년대 후반에 장애학 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태동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권리운동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같은 획기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물론 장애학이 동 법의 통과에 학문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한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민권법의 법적 근거만으로는 ADA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법령을 적절히 지탱해낼 수가 없었다. 다른 인종적 소수자와 여성이 흑인의 인권 보호와 동등한 인권보호를 제공받았었지만. 하나의 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은 그들과는 달랐고 '적절한 편의시설(reasonable accommodation)'과 같은 독특한 법적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ADA가 발의된 이유이며, 그 새로운 법안은 민권법보다 범위에 있어서 훨씬 넓었다.
어쨌든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장애학과 장애인 권리 운동은 손에 손을 맞잡고 발전해왔다. 다시말해, 장애학은 장애를 특별히 시민권 혹은 공민권의 지평 위에 올려놓기 위한 학계와 활동가들의 일종의 협력의 산물인 것이다. 그 후, 한때 의료 전문가와 사회사업가들의 한 작은 영역 이었던 장애학이 지난 10 여년동안 북아메리카와 영국에서 두드러지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에서 장애에 관한 이슈는 사회사업대학에서도 사회사업전공 학자에게도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별개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문제라 하면 사회복지나 특수교육, 재활과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머지않아 장애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이 발전 하리라 본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은 여성학과 같은 분야와 비교될 수 있지만, 얼마간의 중요한 다른 점이 있다. 필자가 여성학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성학이 좀더 관념적이고 태도 * 사고방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장애학은 좀 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을 한다. 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음번 칼럼에서부터 이야기하려 한다. 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음번 칼럼에서부터 '그 밖의 사람(the others)' 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소수자 집단 안에서도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곤 한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동성애혐오와 외견상 모든 차원의 억압에 반대하여 공격적으로 조직된 많은 진보적인 여성 그룹조차 장애인의 삶에 대해 비방적인 관점을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여성 장애인은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의 인권을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과 뭉뚱그려 생각하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데에는 여성학의 여향이 컸다고 생각할 때, 장애학도 하루바삐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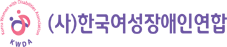
Tel. 02) 3675-9935, 02) 766-9935 Fax. 02)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홈페이지 유지보수 : 그루터기
COPYRIGHT(C)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