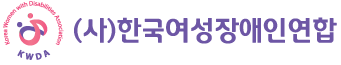64호

- ㆍ 여성장애인 인권저널 「여기」 No.64
- ㆍ (기획이슈)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가?
- ㆍ (핫&포커스 1)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인식하GO! 관심갖GO! 행동하GO!
- ㆍ (핫&포커스 2)우리에게 휴가란, 힐링인가? 고행인가?
- ㆍ (여기, 지금, 우리) 사회심리적장애② 사회적 혐오와 편견
- ㆍ (이야기마당 1) 아무도 안 알랴줌? 우리가 다 알랴줌!
- ㆍ (이야기마당 2) “신·활·력·소” 참가 인터뷰
- ㆍ (그대를 기대합니다) 여성장애인 인권상 수상소감
- ㆍ (우리가 사는 이야기) 나를 찾아 떠나는 희망원정대
- ㆍ (통통한 우리소식) 전북여성장애인연대를 소개합니다.
- ㆍ (두근두근 기억앨범) 사진으로 보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및 지부·회원단체 소식
- ㆍ (별별별 문화추천) 이 책! 이 영화! '내 심장을 쏴라'
- ㆍ (여장연 Fun!Fun!) 낱말맞추기
- ㆍ (여장연 Fun!Fun!) 낱말맞추기 지난 63호 정답
- ㆍ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ㆍ 고마운 분들
<별별별 문화추천>
이 책! 이 영화! ‘내 심장을 쏴라’
- 유영희(前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수필가)
‘내 심장을 쏴라’는 작가 ‘정유정’씨의 작품으로 2009년에 출간되었으며, 2014년 영화로 제작되었다.
작가는 간호대학을 다니던 시절 실습을 나갔던 모 정신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며 이 소설을 꼭 써야 하는 빚이고 숙제가 되었다고 한다. 제 5회 세계문학상 수상작으로, 당시 심사위원들은 ‘내 심장을 쏴라’가 정신병원에 갇힌 두 남자의 탈출기를 그린 감동적인 휴먼드라마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정신병원이나 감금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인권 유린에 촛점을 맞추어 책과 영화를 보았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수리정신병원에는 ‘미쳐서 갇힌 자’와 ‘갇혀서 미친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수명’은 전자 즉 미쳐서 갇힌 자이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폐쇄적인 인간으로, 6년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거듭해온 '정신분열증 분야의 베테랑'이다. 오랜 병원 생활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는 욕구조차 상실했다.
반면 ‘승민’은 후자, 즉 갇혀서 미친 자에 속한다. 가족의 유산싸움에 휘말려 강제 납치되어 수리정신병원에 갇힌 신세이다. ‘승민’은 전직 패러글래이딩 조종사로, 망막세포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승민’은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 마지막 비행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한다.
불꽃축제가 벌어졌던 유원지에 청소를 하러 나왔다가 ‘승민’은 ‘수명’을 데리고 보트 탈출을 시도한다. 총알처럼 보트는 수면 위를 달리고, 추격자들은 그들의 뒤를 쫒는다. 이때 ‘승민’은 윗도리를 벗어버리고, 팔을 벌려 맨가슴을 열어 보이며 포효한다.
“와, 다 와. 날 죽여보라고, 자식들아!”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세상의 총구들을 향해 외치고 있다. 내 심장을 쏘라고. 그래야만 나를 가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트 탈출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둘은 결국 탈출에 성공하고 좁아진 시야로 ‘승민’은 ‘수명’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비행을 한다. 그 후 어디에서도 ‘승민’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수명’은 다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나 그의 삶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환청에 시달리며 끌려 다녔으나 이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넌 누구냐?’고 귀에서 들리는 질문에 ‘승민’은 이렇게 말한다.
‘나야. 인생을 상대하러 나선 놈, 바로 나.’
나는 이 책과 영화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유린의 문제에 주목했다. 병원 밖에서는 그들을 향한 편견과, 시설 내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제투약, 고문에 가까운 전기치료, 여성정신장애인을 향한 성폭력, 노동력착취….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생략되거나 가볍게 다루어졌다. 영화는 인권보다는 휴먼의 문제로 가야하는 탓이었을 것이다. 책을 읽으며 나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장애인 보호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치를 떨었다. 문제는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정신병원이나, 정신장애인들이 입원 시에 겪는 상황이 다르지 않음에 있다.
같은 장애인이지만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정신장애인보건법은 당사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적 인간이 아닌 격리 수용하려는 정책과 제도 속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에, 우리는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아진 마음과 관심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가을이 저물기 전에 책을 펼치자. 케이블 채널에서 영화 다시보기를 찾으면 무료로 볼 수가 있다. 나 아닌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휴먼이며 실추된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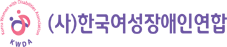
Tel. 02) 3675-9935, 02) 766-9935 Fax. 02)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홈페이지 유지보수 : 그루터기
COPYRIGHT(C)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