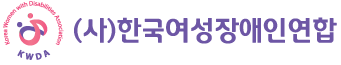49호

- ㆍ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보
- ㆍ (기획이슈) 장애 모델에 기초한 장애 정의의 평가
- ㆍ (Hot 1) “서울시 거주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 ㆍ 여성장애인 정보문화권 확보를 위한 2013 제12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 ㆍ 아ㆍ태 장애인 국제포럼 개최 의의와 전망
- ㆍ ‘유엔장애인권협약 NGO 보고서 연대’의 활동현황과 그 의의
- ㆍ (활동가 이야기 마당 1)
- ㆍ (활동가 이야기 마당 2) 제12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다녀와서
- ㆍ (부설기관 1) 어짜피 태어난 인생, 좀 더 잘 살아보고 죽을랍니다.
- ㆍ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행과 과제
- ㆍ 여장연 소식
- ㆍ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ㆍ 고마운 분들
<기획이슈>
장애 모델에 기초한 장애 정의의 평가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호에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독자들은 이 모델들과 개별 장애 정의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이 모델들을 몇 가지 장애 정의에 적용해 볼까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의 정의를 보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짖봅의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하에서.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하는 사회적 요인은 다루지 않고 단지 이상ㆍ손상에서 기인하는 제약만을 다루고 있고, 따라서 의료적 모델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장애’(disability)를
1)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또는 상당히)(substantially) 제한하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
2) 그러한 소상의 기록. 또는
3)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됨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ADA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ADA가 장애의 범위 안에 현재 손상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손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손상되었다고 인식됨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은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손상, 행위 무능력 및 관계 불리에 관한 국제 분류)에서 손상, 행위 무능력 및 관계 불리를 정의하고 그들 사이에 구별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이것을 1980년에 시험용으로 공표했었다. 그러나 ICIDH의 1980년 판이 이들 정의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은 일상에서 흔히 호환적으로 사용되었었다. 이후 ICIDH의 개정 과정에서 1980년 판에서 사용된 ‘행위 무능력’(disability)이라는 용어가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으로 대체되었고, ‘관계 불리’(handicap)라는 용어는 영어에서의 경멸적 의미 때문에 사용 중지되고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그 결과. 개정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기능ㆍ장애ㆍ건강의 국제 분류)에서 ‘장애’(disability)라는 용어는 “손상, 활동 제한 및 참여 제약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건강 이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의 정황적 요인(contextual facor)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해 왔다. 그러므로 ICF도 생물ㆍ심리ㆍ사회적(biopsychosocial)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라는 두 대립된 모델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국제장애인연맹)에서는 지난 호에 말했던 것처럼 장애(disability)를 “물리적ㆍ사회적 장벽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평상의 생활에 참여할 기회의 상실 또는 제한”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사회적 모델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제2조에서 장애의 15가지 종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간질장애이다. 정부는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발달장애, 그 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중 중증 장애를 중심으로 대상 장애를 선정하여 3차로 장애 범주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물론 이 계획대로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쪽보다는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필요로 한다. 그 과도기적 조치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 정의를 개정해서, 의료적 이상ㆍ손상과 사회적ㆍ환경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ADA나 ICF에서와 같은,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호에 말했던 것처럼, 장애학에서 말하는 장애의 정의 역시 사회적 요소를 매우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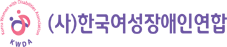
Tel. 02) 3675-9935, 02) 766-9935 Fax. 02)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홈페이지 유지보수 : 그루터기
COPYRIGHT(C)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