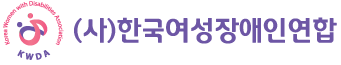67호

- ㆍ 여성장애인 인권저널 「여기」 No.67
- ㆍ (여는글) 인사말
- ㆍ (기획이슈) 여성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모색하다 : 일터에서 여성장애인과 동료로 함께 하려면?
- ㆍ (핫&포커스1)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의 보장, 모두를 위한 진보
- ㆍ (핫&포커스2) 장애등급제 폐지는 CVID로 가야한다.
- ㆍ (여기, 지금, 우리 1) 장애유형별 시리즈-시각장애여성의 인권②
- ㆍ (여기, 지금, 우리 2) 험난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 - 여성장애인의 정치 세력화
- ㆍ (우리가 사는 이야기 1) 헬렌켈러신드롬을 생각한다. 장애는 꼭 극복해야 하나?
- ㆍ (우리가 사는 이야기 2) 임신을 지지 받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 ㆍ (두근두근 기억앨범) 사진으로 보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및 지부·회원단체 소식
- ㆍ (별별별 문화추천) 열대야에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인상주의와 드뷔시
- ㆍ (알아두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보호작업장
- ㆍ (여장연 Fun!Fun! - 낱말 맞추기)
- ㆍ 후원방법·후원신청서
- ㆍ 고마운 분들
장애등급제 폐지는 CVID로 가야한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나오는 용어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장애인의 삶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장애등급제 폐지의 과정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1988년 전면적으로 시작된 장애등급제는 31년 만에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돌봄(′19.7.), 이동(′20), 소득·고용(′22)의 영역에서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comprehensive) 평가해서 만들어지는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다.
장애등급제의 의학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난 종합지원체계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표라 밝혔다.
종합지원체계는 종합조사표를 통해 서비스 기준을 정하게 된다.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을 원스톱 전달체계를 통해 기초상담, 복지욕구조사,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해서 만들겠다는 것이고, 서비스 필요도 분야는 돌봄, 이동, 소득·고용 영역인 것이다.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 평가는 다양한 필요도 평가항목을 통해 점수화한 것이고, 종합조사표로 점수화 된 지표 외 기초상담 내용, 장애상태 등 개인별 특성 고려해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필요한 대상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종합지원체계의 골간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역사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변화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다. 31년간 의학적 손상으로 1~6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변화로 만들어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는 2007년 ‘장애등급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 ‘장애등급재심사’를 의무화했다. 그 과정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1급으로 제한하면서 대규모 등급 탈락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며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면서 시작된 투쟁은 1,842일의 광화문 지하차도의 농성투쟁을 지나 8년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무엇이었는가.
31년의 역사를 가진 장애등급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었는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장애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고, 사회를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게 만든 장애인 차별의 ‘핵심’이다.
장애등급제는 대한민국에서 복지·노동·교육·문화체육, 사회·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재생산하고 낙인을 유포시킨 핵심적 기준이었다. 헌법 제11조 1항,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하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면으로 왜곡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가 권리의 판을 뒤집었고, 기획재정부가 시혜와 동정으로 던져준 쥐꼬리 예산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고 장애유형별 갈등을 조장한 권력자들의 이이제이(李璃) 놀이터에서 장애등급제는 으뜸무기였다. 그 결과는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들은 차별받았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들을 시혜와 동정의 쥐꼬리 같은 예산의 침대에 눕혔다. 그 침대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였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칼을 만들어 31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그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잘라버렸다. 처음에는 다리를, 팔을, 목을 차례로 잘랐다.
송국현이 그렇게 죽었다. 그는 수십 년 꽃동네에서 꽃 취급 받다가 사람취급 받기 위해 시설에서 탈출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고 떨어져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한 날, 그리고 다가온 주일날 교회가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다 불이나 죽었다. 혼자 꼼짝없이 누워있는 송국현의 몸에 불덩이는 팔에, 다리에, 온몸에 그리고 목과 얼굴에 시뻘건 칼로 내려졌고 죽었다. 그때의 분노, 고통, 슬픔을 안다. 우리는 그렇게 한명씩 시나브로도 사랑하는 동지들을 죽음의 강으로 떠나보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환골탈태 과정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내놓고 있는 그럴듯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도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장애등급제폐지를 통해 실현할 미래의 삶은 무엇인가. 아무리 장애가 심한 중증이라도 장애인거주시설이라 불리는 감옥 같은 수용시설과 집구석에 쳐 박혀 가족의 부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완전하게 참여해서 자립적으로 통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장애인 정책의 목표를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 했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라 말하며 ‘약속을 꼭 지킨다’ 했다. 우리가 원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미래의 삶과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등급제폐지의 약속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수준으로 적용되어 궁극적으로 완전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중증장애인이 완전하게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원 기준과 예산을 만드는 힘의 근거가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모습인 것이다.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 환골탈태의 과정인 것이다.
그 과정은 CVID로 되어야 한다. CVID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하게(Complete)’ 통합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실현할 장애인의 권리가 담겨진 정책과 예산이 장애인의 참여 속에서 ‘검증 가능(Verifiable)’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중증장애인이 수용시설에서 「격리」되어 살아서도 아니 되며,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분리·배제·거부」 당하는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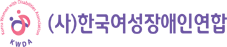
Tel. 02) 3675-9935, 02) 766-9935 Fax. 02)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홈페이지 유지보수 : 그루터기
COPYRIGHT(C)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