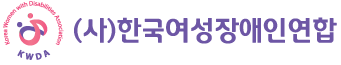70호

- ㆍ 여성장애인 인권저널 「여기」70호
- ㆍ 여는 글
- ㆍ 기획이슈-청각장애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원과 사회진출 기회의 필요’
- ㆍ Hot&Focus 1-붓으로 걷는 자유
- ㆍ Hot&Focus 2-내가 경험한 '공감 격차'
- ㆍ Hot&Focus 3-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역사회 정착 그리고 사례 관리'
- ㆍ 여기,지금,우리 1-전북 탈시설 회원 인터뷰
- ㆍ 여기,지금,우리 2-지부탐방-전북지부
- ㆍ 우리가 사는 이야기 1-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가던 중 있었던 황당한 일
- ㆍ 우리가 사는 이야기 2-향기, 길을 잃다 / 뜨거운 물집
- ㆍ 별별별 문화추천 1-영화 추천 '어른이 되면'
- ㆍ 별별별 문화추천 2-영화 추천 '어른이 되면'
- ㆍ 두근두근 기억앨범-사진으로 보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및 지부·회원단체 소식
- ㆍ 알아두자-장애인 주치의 제도란?
- ㆍ 여장연 Fun!Fun! - 컬러링 색칠
- ㆍ 후원 방법
- ㆍ 고마운 분들
<Hot&Focus 2>
내가 경험한 ‘공감 격차’
서울신문 오세진 기자
최근 ‘출산은 선택, 육아는 함께’라는 주제의 글을 연재한 일을 계기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으로부터 인권저널 ‘여기’에 실을 원고의 기고를 부탁받았습니다. 글을 쓸 때 한국여장연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걱정과 두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동안 장애여성의 삶에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제가 어떤 글을 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에 장애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스스로를 반성하고 공감 능력을 넓히자고 다짐했습니다.
‘공감 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건강권, 특히 여성노동자의 숨겨진 건강 문제를 연구한 과학자 캐런 메싱이 책 <보이지 않는 고통>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고용주나 정책 결정자, 과학자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상상하지 못해 노동자가 왜 아픈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험의 차이에서 공감 격차는 비롯됩니다. 서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는 학자나 의사들은 평소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서서 일하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의 고용주나 정책 결정자, 판사들은 평소 노동자들을 만날 기회도, 그들의 경험을 이해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왜 일을 하면서 아픈지를 알지 못합니다.
공감 격차가 노동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공감 격차를 경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평소 장애여성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취재 현장에서도 장애여성을 만난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장과 젠더차별을 주제로 한 강연장, 성폭력 피해자 또는 여성노동자들의 증언대회에서도 장애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장애여성이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여성들의 목소리를 차단한 환경 속에서 저는 장애여성을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고 당연시하는 성 차별 사회에서 장애여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장애여성은 가족 안에서 빨래, 청소, 식사 준비 등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요구받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애여성이 돌봄을 ‘수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애여성도 ‘노동자’라는 사실 또한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 운동 취재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슬로건은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이동권 보장,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문제였습니다.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장애여성의 모습, 장애여성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전형화’의 오류에 빠져 있었음을. “전형화는 소수자의 삶을 차별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라는 구절이 책 <어쩌면 이상한 몸>에서 나옵니다. 그전까지 저는 개별적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틀에 박힌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글을 써오면서도 장애여성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삶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책에는 여러 장애여성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사례로 샤르코 마리 투스(운동·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겨 손과 발 모양에 변형이 생기고 손과 발 근육에 힘이 빠지는 질환)라는 유전성 질환을 가진 여성의 사연이 등장합니다. 경순씨는 같은 장애를 가진 두 딸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기에 장애가 있는 쌍둥이를 어떻게 키우나 겁부터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경순씨가 두 딸의 장애를 받아들이게 됐고, 누가 뭐래도 아이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도록
당당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자신만의 양육 원칙을 유지하며 딸들을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애여성도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노동 현장이 그렇듯 장애인을 차별하고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자동차 영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인순씨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에 몸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비록 인순씨는 자신의 삶이 “나 한 사람의 발전” 이었다고 정리했지만 필자는 ‘비 장애 남성 사회에서 소수자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뿌리내린’ 삶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제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쳐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마다 장애로 인한 삶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장애여성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야 저의 세상을 보는 시야가 여전히 좁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장애여성들의 다양한 서사들이 지금보다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여성들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이 장애여성들의 ‘일반적인’ 삶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일반적인’ 삶은 정상과 비정상을 끊임없이 나누고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면서 장애여성에게 ‘강요’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장애여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됐습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다양하게 탐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여성의 이야기는 모성만을 강조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했거나, 아이가 장애를 가졌지만 밝게 생활한다는 극복과 감동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몸으로 현실과 맞서며 살아온 장애여성의 각양각색의 삶은 엄연히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불행으로만 여기는 사회가 장애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탓에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사회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열심히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형화의 오류에 빠져 어떤 존재들의 삶을 평면적으로만 묘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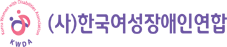
Tel. 02) 3675-9935, 02) 766-9935 Fax. 02)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홈페이지 유지보수 : 그루터기
COPYRIGHT(C)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