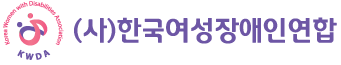70호

- ㆍ 여성장애인 인권저널 「여기」70호
- ㆍ 여는 글
- ㆍ 기획이슈-청각장애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원과 사회진출 기회의 필요’
- ㆍ Hot&Focus 1-붓으로 걷는 자유
- ㆍ Hot&Focus 2-내가 경험한 '공감 격차'
- ㆍ Hot&Focus 3-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역사회 정착 그리고 사례 관리'
- ㆍ 여기,지금,우리 1-전북 탈시설 회원 인터뷰
- ㆍ 여기,지금,우리 2-지부탐방-전북지부
- ㆍ 우리가 사는 이야기 1-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가던 중 있었던 황당한 일
- ㆍ 우리가 사는 이야기 2-향기, 길을 잃다 / 뜨거운 물집
- ㆍ 별별별 문화추천 1-영화 추천 '어른이 되면'
- ㆍ 별별별 문화추천 2-영화 추천 '어른이 되면'
- ㆍ 두근두근 기억앨범-사진으로 보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및 지부·회원단체 소식
- ㆍ 알아두자-장애인 주치의 제도란?
- ㆍ 여장연 Fun!Fun! - 컬러링 색칠
- ㆍ 후원 방법
- ㆍ 고마운 분들
<별별별 문화추천>
‘어른이 되면‘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현지연 활동가
사실 이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처음 요청받았을 때 과연 비장애인의 입장인 나로서 어떤 점들을 느낄 수 있을까 예상을 먼저 해보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간극을 깨닫게 될 것인가 그들을 응원하는 입장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영화를 보기 전의 생각이었기에 보고 난 후에는 아마 달라져있겠지 막연한 상상만을 가지고 있었다.
영화는 대부분 밝은 장면들로 이어진다. 특히나 영화의 시작에선 10여 년을 떨어져서 지낸 언니와 장애인 동생이 함께 살아가려는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서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와 주제의식을 알 수 있었다. 영화의 내레이션 과정에 있어 “장애를 가졌기에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말과 “열세 살부터 서른까지 장애인수용시설에 있었던 동생”이 두 마디가 나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항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주체적으로 살아가야하며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한다. 하지만 이 말이 그동안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었던가? 라는 늦은 깨달음을 갖게 해주었다. 왜 그들에게는 자주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말이다.
동생은 중증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다. 누군가는 동생 옆에서 보호자가 되어 있어주어야 한다. 언니는 동생이 18년이라는 세월을 장애인수용시설에서 보내는 동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들과 조건이 필요했고 이를 충족하기란 어려웠다. 이 장면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단체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일을 하는 중에 있어 여러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이들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 전화가 오는 일들이 종종 있다. 통화내용의 대부분들은 관내 이용하고픈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본인의 자격이 그들이 원하는 부분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우리 단체는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행동하여야 한다고 말이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타인의 삶을 포기”하게끔 한다는 말에서 나는 장애인 본인이 탈 시설을 하고 자립을 한다는 것이 본인에겐 너무나도 큰 의미이지만 주변인에겐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의 탈 시설이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다른 이의 희생을 대가로 할 만큼 장애인들을 위하는 법제나 여러 복지서비스들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시설에서 동생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 나는 이 대목에서 청승맞게도 눈물이 났다. 동생이 생각하는 어른이란 무엇일까? 지금은 할 수 없기에 나중에 하자고 미뤄두지만,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나에게는 다섯 살짜리 조카가 있다. 항상 그 아이도 어른처럼 커피를 궁금해 하고 마시면 왜 안 되는지 묻곤 한다. 나는 그 때마다 아이에게 나중에 키가 커서 어른이 되면 먹을 수 있다고 답을 한다. 아이에겐 뚜렷하게 보이는 물리적인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다. 반면 성인 장애인인 동생은 이미 신체적으론 완성이 되었기에 내가 조카에게 설명해주는 어른과는 또 다른 개념의 어른이 존재할 것이다. 아마 그녀에게 어른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있어 거절당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해 본다.
또한 이 영화에서 동생은 본인이 “사회인”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어떤 이가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사회인이에요. 하는 말을 한다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동생이 말하는 사회인은 이제 더 이상 장애인수용시설이 아닌 더 넓은 세상인 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탈 시설, 자립 등과 같은 단어는 장애인에게만 있어 더욱 의미가 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들을 지지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 수동적인 모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던 영화 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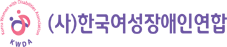
Tel. 02) 3675-9935, 02) 766-9935 Fax. 02) 3675-9934 E-mail : kdawu@hanmail.net 홈페이지 유지보수 : 그루터기
COPYRIGHT(C) 한국여성장애인연합, ALL RIGHT RESERVED.